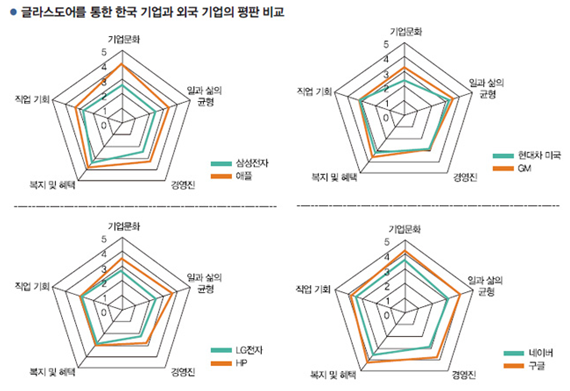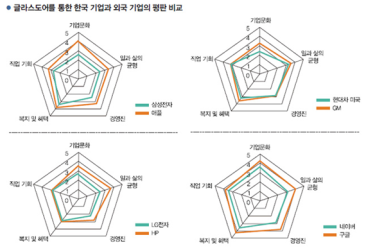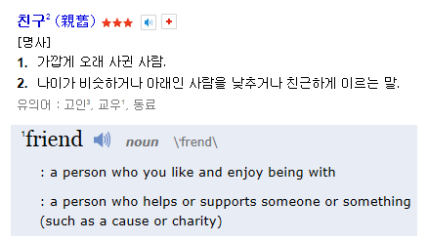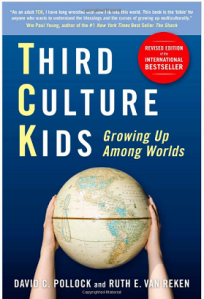“바보야. 세상은 원래 상식적이고 공정하기 보다는 권력을 가진 놈들이 쥐고 흔드는 거야. 회사도 마찬가지지. 너 같이 맨 앞에 서서 큰소리를 내는 사람은 아무것도 얻지 못하고 희생되는 거야. 정 바꾸고 싶다면 일단 가만히 있으면서 위로 올라가서 바꾸면 되지.”
우리 아버지가 예전부터 나를 걱정스러워 하시며 하시던 말씀이다. 아마 비슷한 대화가 많은 부모 자식 간에 수도 없이 오가고 있지 않을까? 나도 자식을 가져 보니 아버지의 심정이 이해가 간다.
***
“이건 정말 아닌데”, “이 방향은 잘못 되었는데”. 누구나 머릿속으로 생각했을 것이지만 대부분은 입 밖에 안 냈을 말. 조직에 속해 있다면 윗사람들의 의견에 소신 것 이야기 하는 것은 큰 Risk 이다. 특히, 어른에 대한 공경을 중요시 할 뿐만 아니라 권위주의와 상명하복이 뿌리깊게 박혀 있는 우리 나라 문화상 ‘잘난 체 하는 놈’, ‘싸가지 없는 놈’으로 찍히기 십상이다. 때문에 아무리 잘못된 지시 사항이라도 위에서 내려오면 그저 내가 아닌 다른 누군가가 나서서 먼저 이야기 하길 바랄 뿐이다.
하지만 그렇게 나서서 이야기 하는 사람은 잘 나타나지 않는다. 말해 봤자 변화는 일어나지 않고, 용기를 내어 이야기 한 당사자만 피해를 보는 경우를 직, 간접적으로 접했기 때문이다. 그렇게 서서히 본인의 소신은 사라져 가고, 윗사람들의 지시에 수동적으로 따르는 샐러리맨이 되어간다. 일에 대한 주인의식 보다는 윗사람을 위한 충성심의 연기력과 눈치만 늘 뿐이다. 참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다.
***
“권력을 더욱 강하게 만드는 것은 바로 침묵이다.”
“Nothing strengthens authority so much as silence.” – Leonardo da Vinci
이렇듯 한국 사람들이 가장 잘 하는 것은 불만 표시하지 않고 견디기 이다. 아무리 비합리적인 처사를 받아도 침묵한다. 이러한 침묵은 치킨게임과 같다. 먼저 버티질 못하고 조직에 불만을 표시하며 불응하는 놈은 찍혀서 경쟁에서 뒤처진다.
교수들이 학생들을 착취를 해도, 회사에서 상관이 비합리적인 근로를 시켜도, 정부가 특정 기업이나 조직의 편의를 봐 줘도, 운동 연맹들이 파벌을 만들어 편파판정을 해도, 군대에서 상관이 인격적인 모독과 폭력을 행사해도 오로지 침묵 뿐이다.
“그래도 난 살아 남았어.”
“경쟁자 한 명은 따돌렸네.”
이러한 누가 상사 비위 잘 맞추고 묵묵히 따르나를 가지고 경쟁하는 것은 장기적으로 모두를 파멸로 몰고 간다. 이렇게 견제 받지 않는 권력은 더더욱 견고해 지고, 권력을 휘두르는 것을 당연시 여긴다. 오늘날의 국정농단사태가 이러한 침묵들이 모여서 생긴 대표적인 예 아니겠는가? 흥미롭게도 대한민국 최고의 기득권 자가 휘두른 권력과 비합리적인 행동들에 대한 분노로 인해 우리는 답을 찾았다.

“어둠을 탓하기 보다는 한 자루의 촛불을 켜라.”
“It is better to light a candle than curse the darkness.” – Eleanor Roosevelt
개개인으로 큰 힘은 없지만, 작은 촛불들이 모이면 가장 강력한 자리에 있는 기득권이라도 끌어내리거나, 적어도 불합리한 행동들에 대한 책임을 물릴 수 있다. 이것은 회사, 군대, 협회 등 어떠한 조직에서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한다.
더이상 비합리적인 지시에 무조건 침묵 하기 보다는 왜 그런 지시를 하였는지에 대해 질문을 하고, 더 나아가서는 부정적인 의견을 표현해야 한다. 물론, 본인이 가늠 할 수 있는 한도 내에서 말이다. 이러한 사람들이 많아 질수록 비합리적인 지시를 내릴 때 한번 더 생각 하게 될 수 밖에 없다. 이렇게 조금만 더 불편하게 만드는 것만 해도 작은 승리라고 본다.
당연히 아직도 기득권, 권력을 가진 자들에게 ‘반항’하는 것에는 Risk가 존재하고, 변화는 고통스럽고 한순간에 이루어지지 않는다. 하지만 이번 기회를 통해 침묵이 가져 올 수 있는 무서움과, 변화를 가져 올 수 있다는 희망을 봤다고 생각한다. 이번 국정논단사태와 촛불집회를 통해 대한민국은 새로운 전환점을 맞이했다고 생각한다.
***
Jinki is a career & recruiting consultant, and a cross cultural trainer living in Seoul. You could find more about him(both in Korean & English) if you visit his introduction page here.
저자인 은진기는 서울에서 활동하고 있는 커리어 컨설턴트/헤드헌터 이자 이문화 교육 전문가이다. 그에대해 더 알고 싶다면 여기를 클릭하세요.